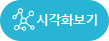| 항목 ID | GC00700043 |
|---|---|
| 한자 | -汁- |
| 영어음역 | Goun Gamjeubeul Deurin Garot |
| 이칭/별칭 | 갈중이,갈등지게,갈적삼,갈잠뱅이 |
| 분야 | 생활·민속/생활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 집필자 | 현진숙 |
[개설]
감즙으로 염색해서 만든 제주도 특유의 옷인 갈옷은 제주도의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고안된 최고의 노동복이었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밭일을 해야 하고 또 가시덤불을 헤치며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는 목자나 테우리들, 물속에서 작업을 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갈옷은 최고의 노동복이었다.
전통시대에 애용되었던 갈옷이 근래 재조명되면서 부활하고 있다. 건강 차원에서 천연 염색이 각광을 받으면서 갈옷이 소중한 자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동복에 국한되었던 갈옷이 다양하게 디자인되면서 외출복뿐만 아니라 침구류와 생활 용품, 실내 장식 재료로 활용되어 현대적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갈옷]
갈옷은 입으면 시원하고 땀이 나도 몸에 달라붙지가 않고 땀이 묻은 옷을 그냥 두어도 썩거나 냄새가 나지 않아서 하루하루의 삶이 노동이고, 물이 귀한 제주도에서는 최상의 조건을 구비한 노동복이자 일상복이었다. 근래 들어 갈옷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어 갈옷이 화학 염료로 염색한 옷에 비해 항균성이 뛰어나고 자외선 차단 효과가 완벽에 가깝고, 이러한 항균성과 자외선 차단 효과는 세탁에 의해서도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보고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춘 노동복인지 모른다.
갈옷의 색깔도 제주 흙 색깔과 비슷하여 더러워져도 쉽게 눈에 띄지 않고 또 감 염색으로 인해 옷감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더러움도 덜타고 더러워진 것도 주물럭거려 활활 헹궈서 널면 되어서 참 편리하고 위생적이며 경제적인 옷이다. 또한 통기성이 좋고 풀을 먹인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촉감도 좋고 시원한 느낌을 줄 뿐 만아니라 물이나 땀에 젖어도 몸에 달라붙지 않고 또 빨리 건조되어서 활동하는데 불편함을 덜어준다.
감 염색으로 인해 빳빳하게 풀 먹인 옷처럼 되기도 하지만 강도가 강해져 질겨진다. 그래서 삼베옷을 입다가 헐어서 후줄근해지면 감물을 들여 입었다. 갈옷은 가시덤불 사이를 지나가도 잘 걸리지 않고 걸려서 찢겨지는 일도 드물며 보리 까끄라기 같은 오물도 쉽게 달라붙지 않고 만약 붙었다가도 털면 잘 떨어진다. 이와 같은 성능을 가진 갈옷은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생활 환경에 적합하여 지속적으로 애용되어 왔다.
[복식 문화의 토착화]
제주도 복식사를 파악하기 위한 역사적인 기록물이나 유물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보면 갈옷을 언제부터 입게 되었는지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단편적인 기록을 토대로 살펴보면, 제주도의 초기의 의생활은 자연 환경과 지리적 조건에 적응하여 제주만의 독특한 양식을 갖고 있다가 외부와의 문물 교류로 외부의 양식과 혼합하여 새로운 제주의 복식 문화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갈옷에 대한 자료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다만 지금으로부터 약 700여 년 전에 고기잡이 할아버지가 낚싯줄이 자꾸 끊어짐을 못 마땅히 여겨 감물을 염색한 결과 질기고 또한 고기도 더 잘 잡혔다는 이야기가 있다. 시대적으로는 고려시대로 추측되는데, 감물을 이용하여 낚싯줄에 염색하는 풍속은 중국 남부 지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감물 염색은 예로부터 한국, 일본, 중국, 타이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행해져 왔다는 문헌 기록 등이 있어서 오래 전부터 감을 이용한 염색이 제주도 주변국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는 서력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한반도와 중국과 그리고 일본을 연결하는 동방 교역로를 통한 국제 무역의 축으로 편입되어 있음을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화천(貨泉)을 비롯한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려시대부터는 제주도가 고려의 일반적인 지배체계에 편입되어 중앙의 직접관리 대상이 되었다. 특히 고려 충렬왕 3년에 몽고가 제주도를 목장으로 쓰기 위해 100여 년간 점거하게 되는데 이때 몽고의 문화가 제주도에 유입되고 복식 문화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새로운 문화가 이입되어 토착화되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 제주도 복식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실용성과 편리성, 경제성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복식 문화가 들어오더라도 이러한 조건에 부합이 되었을 때에 정착이 되고 또 지속되어진다고 본다.
감물을 이용한 염색도 이러한 맥락에서 받아들여지고 지금까지 지속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로부터 제주도 가정에서는 울타리에 감나무가 한 두 그루씩 심고 있었다. 갈옷을 만드는 용도로도 쓰여졌지만 감을 소금물에 담가두거나 겨에 묻어두었다가 떫은 맛이 사라지고 나면 맛있는 간식거리가 되었다. 어떻든지 감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기후적인 풍토이고 감물로 염색하여 사용한 결과 좋은 점이 많음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 지속될 수 있었다고 보아진다.
[감물로 염색하는 방법]
감물로 염색하는 것을 제주도에서는 감물 들인다고 한다. 감물 들일 때는 제주도 토종감을 풋감일 때 따서 즙을 내어 사용한다. 토종감이 염색하기에 알맞은 시기는 음력으로 6~7월이다. 특히 7월 칠석을 전후한 시기가 햇빛도 좋고, 농부들이 밭에서 김을 매고 나서 한숨 돌릴 시기이기도 하다.
감은 따서 오래두면 떫은 맛인 타닌이 줄어들게 되므로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간에 으깨어 물을 들여야 한다. 그래서 아침을 먹기 전에 감을 따다가 으깨어 물을 들여 널어 논 다음 아침을 먹었다고 한다. 새벽녘에 감을 따서 바로 으깨어 물을 들인 것이다.
감물은 미리 옷을 만들어 놓은 다음 들이는 것과 직물에 직접 물을 들이는 방법이 있다. 감즙은 직물 표면에 코팅(coating)막을 형성 할 뿐만 아니라 섬유와 섬유사이를 메꾸어 빳빳하기 때문에 바느질하기가 힘이 든다. 그래서 옷을 미리 만들어서 염색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널기를 잘 해서 햇빛이 골고루 받게 해야 색깔이 곱다. 직물에 직접 들일 때는 물을 약간 섞어 빳빳함을 완화시켜 주어야 바느질하기가 수월하다.
염색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미리 옷이나 옷감은 빨아서 풀기를 빼고 햇볕에 널어서 하얗게 바래어 놓는다. ② 풋감을 으깨어 즙을 내는데 요즘은 분쇄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전통적인 방법은 남도구리에 감을 넣고 공이로 으깨었다.
③ 염색하고자 하는 옷이나 옷감에 으깬 감즙이 골고루 스며들도록 치대면서 주물럭거린다.
④ 옷이나 옷감이 완전히 젖게 즙이 베어들었으면 옷이나 옷감에 묻은 감 찌꺼기를 털어내고 옷을 원형대로 잘 손질하여 햇빛이 잘 드는 평평한 곳에 널어 말린다. 멍석을 깔아서 말리거나 처마에 혹은 깨끗하고 평평한 돌 위에 널어서 말린다. 요즘 들어서 대량의 옷감에 염색을 하여 말릴 때에는 잔디밭에 널어 말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
⑤ 염색하여 말릴 때에는 완전히 마르기 전에 손 다듬이와 발 다듬이를 하여 옷의 원형을 잘 만들어 주어야 하고 또 햇빛을 골고루 받아서 균일한 색이 나도록 뒤집어 주어야 한다. 완전히 바싹 마르고 나면 물을 적셔서 다시 말리기를 반복하면 황갈색으로 색이 나기 시작한다. 발색은 초기에 급속히 이루어지는데 7회 이상 반복되면 색차가 작게 나타나고 좀 검은 빛을 띠게 되며 시간이 더 지날수록 오히려 색이 퇴색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발색할 때 주의사항은 햇빛과 손질에 있다. 햇빛을 얼마나 잘 골고루 받느냐에 따라서 색도 곱게 나고 또 풀기도 빳빳하게 살아 있다. 또 손질을 잘 하여 주름지지 않도록 잘 펴서 널어야 균일한 색으로 발색된다. 말리는 장소도 습기가 있으면 색도 곱지 않고 거무스름하게 되어 버리고 풀기도 없어진다.
근래에 들어서 분쇄기를 사용하여 한 번에 많은 양의 감을 으깨고 착즙기로 즙을 짜서 사용하기 때문에 힘도 덜 들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염색 할 수 있다. 그리고 즙만 가지고 염색을 하기 때문에 감 찌꺼기가 옷에 달라붙어서 얼룩지는 것을 방지 할 수도 있다.
감물 들이면서 남는 찌꺼기는 다시 재활용되는데 감씨는 좋은 간식 거리로 쫀득쫀득한 맛이 일품이다. 그리고 감 찌꺼기를 가지고 나무 마루를 닦으면 반들반들 윤이 나고 방부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긴 장마철로 썩기 쉬운 나무 마루가 잘 썩지 않는다.
[갈옷의 종류]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에서 펴낸『생활상태조사』에 갈옷을 많이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당시에 많이 입었던 갈옷은 남자는 갈적삼과 갈중이이고, 여자인 경우는 갈적삼과 갈굴중이로 나뉘어 진다.
남자의 갈적삼은 저고리의 형태의 남자상의(上衣)에 감물을 들인 것이다. 저고리가 겹인 것에 비해 갈적삼은 홑겹으로 되어 있다. 갈적삼의 형태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하여 동정이 없고, 고름 대신 단추를 달았으며 길이도 길어진다. 그러다가 목둘레가 둥글게 파진 마고자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 갈중이는 평상시 입는 남자용 바지와 똑 같다.
여자의 갈적삼은 일반 저고리와 같으나 홑겹으로 되어 있으며, 여밈은 고름에서 점차 매듭단추로 바뀌었고 저고리보다 길이도 길어지게 되었다. 갈굴중이는 단속곳과 같은 것이다. 평소에 단속곳은 집안에서 일을 할 때나 잠깐 문밖 출입을 할 때 입었던 옷인데 감물을 들여 입음으로써 갈굴중이라 부르고 무릎 아래에서 대님으로 묶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고 노동일을 하였다.
차츰 바짓부리를 좁게 하면서 바짓부리에 단을 달고 허리 트임을 양쪽 옆으로 만들어서 허리끈을 앞. 뒤로 각각 옆에 2개씩 달았다. 먼저 앞자락 끈을 허리 뒤로 여미고, 다음 뒷자락 끈을 앞으로 와서 여몄다. 바짓부리에 단을 달아서 간편하고 특히 용변을 볼 때는 허리 전체를 내릴 필요 없이 앞쪽에 여민 뒷자락 끈만 풀면 되었다. 이 옷은 평상복으로 입어서 남의 집에 의례적인 정식방문이 아닐 때는 언제든지 입고 다녔다. 그러다가 허리에 고무줄을 넣은 몸뻬가 등장하면서 간편한 몸뻬에 감물을 들여 오늘날까지 입게 되었다.
[현대에 부활하는 갈옷]
1950년대에서 1960년대의 제주도민의 생활 모습을 담은 사진에서도 서민들은 대부분 갈옷을 입고 있다. 그러다가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직물이 다양해지면서 갈옷도 점차로 사라지게 되었다. 근래에 들어서 건강 차원에서 천연 염색이 각광을 받으면서 갈옷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함께 소중한 자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갈옷은 천연 염료로 염색하여 색상이 은은할 뿐 아니라, 옷감이 빳빳하므로 세탁한 뒤 풀을 먹이거나 다림질을 하는 등 잔손질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또 몸에 잘 달라붙지 않고 열전도율이 낮아 시원하며, 감즙이 방부제 역할을 하여 땀에 옷감이 상하지 않아 여름철 옷으로 적합하다.
그동안 노동복에 국한되었던 갈옷이 다양한 디자인으로 인해 외출복뿐만 아니라 침구류와 생활용품, 실내 장식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염색 방법도 새로운 시도로 색상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기상 변화로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것이 감즙을 냉동 저장해 두었다가 기상 조건이 허락하면 염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자외선 장치를 하면 계절에 상관없이 감 염색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노동복으로 입었을 때는 세탁할 때 비누를 사용하지 않고 물에만 헹구면 되었지만 요즘 들어 기름 먼지와 외출복으로 입게 되면서 세탁으로 인해 변색되는 경우가 많다. 변색을 막기 위해서는 중성 세제나 산성 세제의 사용이 필요하다. 알칼리성 세제에는 검게 변색이 되는데 이럴 경우는 헹구는 물에 아세트산을 첨가하면 색상이 환원된다. 집에 아세트산이 없을 경우는 식초를 이용해도 좋다.
- 진성기, 『남국의 민속』(교학사, 1977)
- 진성기, 『제주민속의 멋』(열화당, 1979)
- 박순자, 『갈옷-그 특성과 전망-』(경춘사, 2001)
- 『제주의 역사와 문화』(국립박물관, 2001)
- 『제주여성문화』(제주도, 2001)
- 현혜경, 「제주도 복식에 관한 연구: 해녀복과 농민복(갈옷)의 실물을 중심으로」(수도사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 이혜선, 「감즙처리포의 물성에 관한 연구」(『제주대학교논문집』, 1991)